시습재 일기
* 이번 호부터 3개월에 한 번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소속 학생들의 일상과 삶을 소개하는 “시습재 일기”코너가 시작됩니다. 차세대 한국학자로 거듭나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풀꽃
허수미
사회과학부 사회학전공 석사과정생
작년 이 맘 때쯤이다. 사감보의 뒤를 따라 걸으며 나는 들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는 설렘보다 가족 외에 다른 누군가와 일상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내심 걱정이 된 터였다. 개강일이 되서야 입사를 한 까닭에 여분의 침대가 남아있는 방이 곧 보금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빈자리를 찾아 헤맨 끝에 다다른 어느 방 문 앞. 몇 차례의 노크 후 열린 문 뒤로 작은 체구의 베트남 학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눈인사와 함께 건넨 미소는 수줍음이 가득한 아이와 같았다.
하지만 역시나 타인과, 그것도 국적이 다른 구성원과 한 방을 쓰는 건 그리 만만치 않았다. 첫 학기의 대부분은 생활패턴을 조율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았으나 오늘을 보내고 또 다른 오늘을 맞이하는 공간에서 룸메이트와 나의 리듬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과제였다.
첫 번째 숙제는 별의 궤적을 쫓는 것과 모닝커피를 내리는 것 사이에서 각자의 위치를 다듬는 일이었다.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알람 없이도 매일 오전 6시 40분이 되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늘 같은 모양으로 이불을 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매 끼니마다 사용되는 향신료와 식재료였다. 특히, 생선으로 만든 젓갈과 여러 가지 해산물을 곁들여 담근 장아찌는 뚜껑을 살짝 여는 것만으로도 깊고 진한 여운을 남겼다.

<룸메이트와 만들어 먹었던 쌀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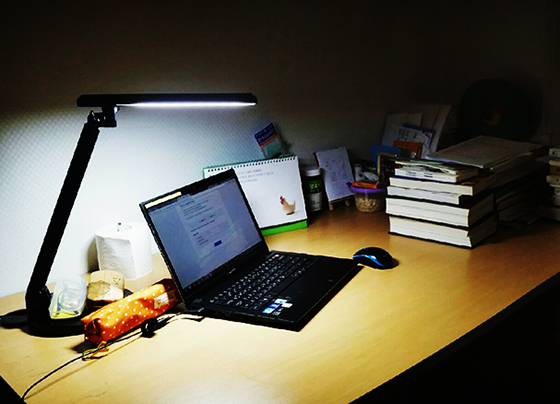
<새벽녘 잠들지 못하는 나의 책상>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 둘은 서로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나누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룸메이트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 덕분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활용한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나타내는지에 대한 확인과정은 필수였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이상, 정해진 일과가 끝나면 수시로 마주 앉았다. 그러다 보니 이는 어느새 당연한 하루의 일부가 되었고, 처음과 달리 이야기의 주제도 다양해졌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과정, 주거형태, 전통의복, 사회규범 등을 비롯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계절별 피부 관리법, 첫사랑과의 러브스토리, 부모가 되어가는 여정 등.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는 동안 그렇게 나는 자세히, 또 오래 그녀를 보았다. 물론, 그녀도 나를 보았다. 각자의 고유한 박자를 유지하며 함께 소리를 내는 것이 작년 이 무렵에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 생각했었다. 밤과 아침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으니 말이다. 하지만 ‘또롱-또롱-’ 아침마다 필터를 통과하는 커피 방울 소리에서 이제 나는 정다움을 느낀다. 그리고 룸메이트의 노트북 화면 너머 학교와 유치원 갈 준비에 바쁜 세 아이의 등굣길을 마음으로 배웅한다. 점심시간에는 종종 그녀가 내민 베트남산 장아찌에 쌀밥 한 그릇을 쓱쓱 비벼 금세 비워낸다. 때론 한 그릇 더 추가하면서. 엊그제에는 다이어리 한 켠에 느억 짬( )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적어 두었다.
)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적어 두었다.
시인 나태주는 풀꽃을 보고 말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여기 시습재에도 풀꽃이 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풀꽃 두 송이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피어 있다.
